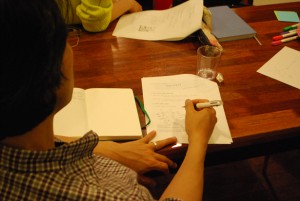‘원시’,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릴까? 현대 문명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시’란 단어는 친근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원시가 진짜 원시인지, 아니라면 진짜 ‘원시’는 무엇인지 궁금해 답을 찾기 위해 녹색인문학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원시’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원시’에 대해 경멸과 비하의 눈초리를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원시’에 대해 동경하거나 원시를 미화하여 생각한다. 전자는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인종에 대한 서열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후자는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 또는 이국적 취미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원시’와 ‘문명’에 대해 떠오르는 상반된 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개와 발달, 자유와 규율, 불편과 편리, 불결과 청결, 감성과 이성 등등 여러 대립되는 개념들이 떠오른다. 이처럼, ‘원시’와 ‘문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들에 부여한 이미지는 다양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구성되어지고 덧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남아 있으리라 여기지는 원시 사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정글의 법칙’만 봐도 그렇다. 원시는 정말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자연의 모습만이 존재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사건들의 연속일까? 사실은 우리 시대의 미디어 선정주의에 의한, 관광 상품화를 위한 연출이 방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작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익숙한 ‘문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문명의 시작은 ‘농경’과 ‘가축 사육’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들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이 자연을 의도대로 조작하고 변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명의 시작은 ‘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은 인간 외에 어떤 동물도 다룰 수 없다.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지기 시작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간소화됨에 따라 직립할 수 있게 되었고, 밤에 다니는 맹수들을 피해 낮에 활동하며 밤에는 불을 이용해 자신들을 보호하였다. 또한 문명이 시작하면서 지식과 이를 위한 문자가 생겨나고, 국가가 탄생했다. 지배-피지배 관계가 고착됨에 따라 인간의 도구화와 전쟁의 조직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명이 가진 특징들의 핵심은 ‘길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원시인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남겨진 그의 어록들 중 “비록 어떤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매우 친근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그들이 즐기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웃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를 바라보는 원시인의 시각이 새롭다.
‘원시’와 ‘문명’, 우리가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바탕(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소박하기만 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없다면 촌스럽다. 형식이 지나쳐 본 바탕을 넘어서면 겉치레에 불과하다. 바탕과 형식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원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원시’와 ‘문명’ 중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녹색인문학 장학생 서가인
*사진: 작은것이아름답다